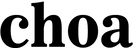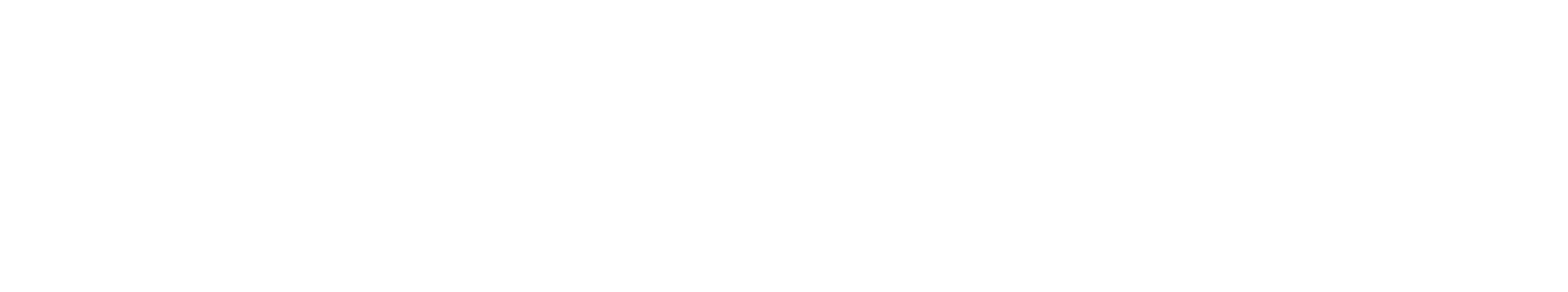The Danger of Watering Down Others’ Pain: Climate Change and Refugees
다른 이의 고통을 희석하는 것의 위험성: 기후 변화와 난민
by Jiwon Chun 전지원
My favourite part of preparing a refugee application is writing the narrative, because it is a unique opportunity for a refugee claimant to speak about their experience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the structure of the application forms. The narrative is a summary of a refugee applicant’s life story, with an emphasis on the basis of their refugee protection claim. These claims can fall under one of the five categorie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but everyone’s story is unique.
I would think it is needless to say that everyone’s story is unique, but for some people, these stories can be reduced to a category and—even worse—be met with skepticism, solely based on the stereotypes surrounding “these kinds of cases.” The degree of skepticism can be greater if there is a lack of established case law about similar cases or if there are negative ones.
Everyone’s story is unique, but for some people, these stories can be reduced to a category and—even worse—be met with skepticism, solely based on the stereotypes surrounding ‘these kinds of cases’ |
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매일 투쟁이었다. 물론 의뢰인 본인의 투쟁에 비하면 나의 투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국에서 난민을 돕는 단체에 출근한 첫날, 처음으로 난민 신청자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서의 판례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서의 판례를 찾는 것이 나의 일이었지만, 사건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비슷할지는 몰라도 상담을 하면서 내가 느낀 그녀의 고통이 다른 어떤 이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 또는 그녀 외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녀의 경험이 그저 “그런 일 중 하나”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익히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판례를 충분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판례가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판례뿐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험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
There were also cases where the grounds for the refugee claims were so rare that it was impossible to find enough precedents. In these instances, even the precedents that I did find were often not very helpful or as relevant as I wanted them to be. Does that mean that the experience of those refugee claimants would not be recognized?
Skeptics of climate change activism may say that climate change is not a threat, or that if it is, it is merely a small one. However, the number of people fleeing their homes due to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that includ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These people are often called “climate refugees.” While the term may seem intuitiv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suggests that they should instead be referred to as “persons displaced in the context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1)." UNHCR’s reasoning for not endorsing the term “climate refugee” is a technical one—that climate change affects people inside their own countries and typically results in internal displacement before it displaces people across borders, which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a “refugee” under the Convention. This protection gap also arises because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often not considered “persecution,” making it difficult to link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one of the grounds set out in the Convention (2).
Making such technical distinctions should not prevent us from being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as a social phenomenon. Rather, we should recognize its perils and take action before it rises to the level of displacing people across borders. In its May 2018 briefing, the European Parliament echoed this sentiment and stated that the European Union, while not recognizing climate refugees formally, has taken action to develop resilience in countries potentially affected by climate-related stress (3).
기후 변화의 문제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며 심지어 위협이라 인정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과 동시대를 사는 어떤 이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공포 때문에 집을 떠난다. 그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4) 에 포함된 “난민”의 정의에 의하면 기후 변화를 “위협”이라고 정의하기도 어렵고 위협이라고 해도 난민 협약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박해 이유와의—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그리고 정치적 견해—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기후 난민”이라 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난민 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본인의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지만 기후 난민의 경우, 보통 해외로 이주하기 전 국내 실향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국제난민기구의 입장이다. 그래서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가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 변화가 위협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해외로 이주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기후 변화를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고 지금 그것과 씨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Arguments made by skeptics of climate change are awfully similar to comments that I have heard people make about refugee claims, regardless of which of the five categories they fall under—that they can’t be real or that they can’t be that bad. As a lawyer in a hearing room, I can only put forward as much evidence as my client and I are able to gather to prove the basis of their claim. This evidence must be specific to that individual claim and acceptable in hearings (5). It needs to persuade decision-makers that they should believe my client—that is, if decision-makers conduct themselves in a professional and ethical manner with a commitment to openness, as they are trained to do. Outside of the hearing room, I can advocate more strongly about the social phenomena that these individuals are often caught in. Climate change is no exception. Sometimes, many voices are required to have an issue be heard, but a hearing is about one specific client, and all evidence should be relevant to the individual claim at hand. Outside of these hearings, I can pay attention to anecdotes that may not be as polished as a narrative or be appropriate as documentary evidence at a hearing for a particular claim, but are still important to forming a narrative about the overall issue.
Sometimes, many voices are required to have an issue be heard, but a hearing is about one specific client, and all evidence should be relevant to the individual claim at hand. |
기후 변화의 문제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난민 신청자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 그 고통의 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판단할 거라면 그 주제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난민 인정 절차도 의사결정자 개인의 판단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와 많은 서류상의 증거가 오가는 것처럼 말이다. 증거에 덧붙여 개인의 편견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의사결정자가 난민 신청자의 상황을 이해를 하며 신청자 개인 또는 신청자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리는 지침서도 있다. |
변호사로서 난민 심사장에서 한 의뢰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증거와 할 수 있는 단어 선택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가 닿지 않는 곳에서 나는 난민 신청자들이 집을 떠나온 이유는 보통 비단 개인의 사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Climate change, which displaces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is not about the natural cycle of the earth that evolves slowly, but rather the abrupt changes in temperature that humans are causing today. The latter notion of climate change is not only a physical phenomenon, but also a social one because it negatively influences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 first came across the term “climate refugee” in a YouTube video by AJ+ (6) called “How El Salvador Is Creating Climate Refugees.” The video talked about how many people in El Salvador do not have access to drinkable water because of the drought that affected the Central American Dry Corridor (7) including El Salvador, as well as attempts by transnational companies to privatize water, which is said to be supported by the country’s right-wing parties. In this example, we see stakeholders from all three systems—social, political, and economic—taking a position on who owns the water supply. Caught in the middle are internally displaced people who are close to becoming “climate refugees.” It has been almost two years since this video was released in January 2019. Seeing how the devastat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continue to affect thousands of lives around the world, I have grown restless.
Because climate change is a global issue, the solution for climate refugees must also be global. |
Because climate change is a global issue, the solution for climate refugees must also be global. There needs to be a multilateral effort to recognize that more “climate refugees” will appear and that they will need a place to flee to. We can perhaps start by acknowledging climate change as an established category, along with the five categories currently included in the 1951 Convention. |
AJ+사 (8) 의 영상을 보고 처음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엘살바도르 및 주변 국가에 닥친 가뭄으로 인해 식수가 부족해지며 그 부족한 식수를 엘살바도르의 우파 정치인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민영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한 “기후 난민”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일례만 봐도 기후 변화란 물리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회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위 영상은 2019년 1월에 공개되었고,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더 암담하다는 걸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삶을 위태롭게 하는 “기후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지구의 순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일컫는 것이다. 위의 예처럼 말이다.
기후 변화가 세계적인 사안인 만큼 기후 난민을 위한 해결책에도 여러 나라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기후 변화를 늦춘다고 해도 이미 영향을 받은 이들은 기후 난민이 되어 버렸고 앞으로 더 많은 기후 난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시작점은 기후 변화를 난민 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이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 "Climate change and disaster displacement".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HCR, December 2010.
(3) "EU asylum, borders and external cooperation on migration". European Parliament, May 2018.
(4) "1951 난민 협약". 유엔난민기구.
한국어로 번역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
(5) Due to the different treatment of inadmissible evidence by courts and immigration boards, the term "acceptable" was used, instead of "admissible," as a more general term—not all evidence will be accepted or weighed in just because they are related to the specific claim. For more information.
(6) Online news and current events channel run by Al Jazeera Media Network.
(7) Central American Dry Corridor (CADC) is a tropical dry forest region on the Pacific Coast of Central America, where severe drought has become a significant problem causing losses of crops and millions of people in need of urgent food assistance.
(8) 알자지라 미디어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채널.